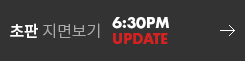저성장 시대, ‘경쟁력’을 갖기 위한 7가지 전략
[따끈따끈 새책] ‘경쟁력’…“해외 파견한 삼성의 글로벌 전략을 보라”
김고금평 기자2016.08.26 19: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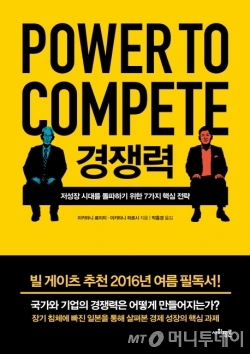
영국의 브렉시트 이후 일본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가 취하는 이 같은 양적 완화 정책은 경쟁력을 잃은 세계의 초라한 자화상이자 불가피한 선택일 뿐이다. 이제 경쟁력은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할까.
하버드 출신 세계적 경제학자 미키타니 료이치와 그의 아들 히로시가 대담 형식으로 꾸민 ‘경쟁력’은 일본을 중심으로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쇄신할 혁신적인 시선을 7가지 키워드로 던진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혁신의 방안들이 실제 경험론을 통해 제시된다.
일본은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도 왜 세계적 기준에 따라가지 못하고 소비자의 외면을 받는가. 저자가 가장 먼저 든 성공 사례는 삼성이다.
“삼성은 해마다 직원 수백 명을 전 세계 수십 개 나라로 보내요. 각국에 지역 전문가를 양성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신사업에 착수하기 전 일단 현지 시장에 가서 봐야 한다는 자세를 가지고 있죠. 해외로 파견된 직원은 1년간 자유롭게 학교에 다니거나 연구를 하고, 극단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해요. 삼성은 이런 방식으로 세계화 전략을 발전시키고 있어요.”
한국의 기업은 ‘혁신’을 향해 나아가는데, 일본의 기업은 문밖에서 벌어지는 변화에 눈을 감는 에도 시대의 ‘퇴보’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소위 소비자 가전 분야에서 일본은 세계적 기준에서 멀어지는 ‘갈라파고스 현상’에 놓여있다고 저자는 진단했다.
아버지 료이치는 조지프 슘페터의 ‘혁신’ 이론을 꺼내며 “혁신은 곧 새로운 연결성”이며 “창조적 파괴”라고 설명한다. 경제 성장은 새로운 것들의 조합을 통해 창출되는 것인데, 일본은 여전히 해외 유학생 숫자가 줄고 외국 기업이 일본에 본사를 두는 경향도 점점 쇠퇴하는 현실에서 혁신과 역행한다는 것이다.
히로시는 2013년 초 아베노믹스의 콘트롤타워 세 곳 중 하나인 산업경쟁력회의의 위원으로 일한 경험을 들려주며 “일본 경제가 스태그네이션(장기 경기침체)에 빠진 원인 중 하나가 관료 주도의 산업 정책”이라며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특히 IT(정보기술) 분야에서 아우토반 개념을 제시했다. 통행료나 속도 제한 없는 독일의 아우토반처럼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저렴한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자는 제안이었다.
히로시가 경쟁력 강화의 두 번째 축으로 삼는 것은 경영자의 역량이다. 글로벌 트렌드를 분석할 능력이 안 되는 경영자, 해외 진출 역량이 부족한 경영자들은 도의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닛산을 환골탈태시킨 카를로스 곤, 고사 직전의 애플을 살린 스티브 잡스 등 기업을 이끄는 사람이 ‘누구인가’가 비즈니스 혁신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저자는 봤다.
종신고용제 같은 경직된 노동 시장에 대한 경고도 잊지 않는다. 히로시는 은행에 근무할 때 수천억 엔(한화 수조 원)을 들여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 비용을 절감하려 했지만, 결국 인력을 줄이지 못해 낭비가 더 커진 사례를 들며 노동 유연성이 혁신의 촉진제라는 사실도 강조했다.
이들 부자는 혁신, 운영능력, 아베노믹스에 의문을 제기하는 힘, 저비용 국가구조, 글로벌 경쟁력, 교육, 브랜드 등 저성장 시대를 돌파하기 위한 7가지 쇄신 전략을 가감 없이 제시한다.
한국 사회라고 다를까. 소비심리가 하락하고 최악의 청년 실업률을 기록하는 상황은 어쩌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흔적을 좇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경쟁력=미키타니 료이치, 미키타니 히로시 지음. 박홍경 옮김. 사회평론 펴냄. 264쪽/1만6000원.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